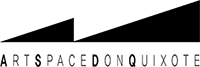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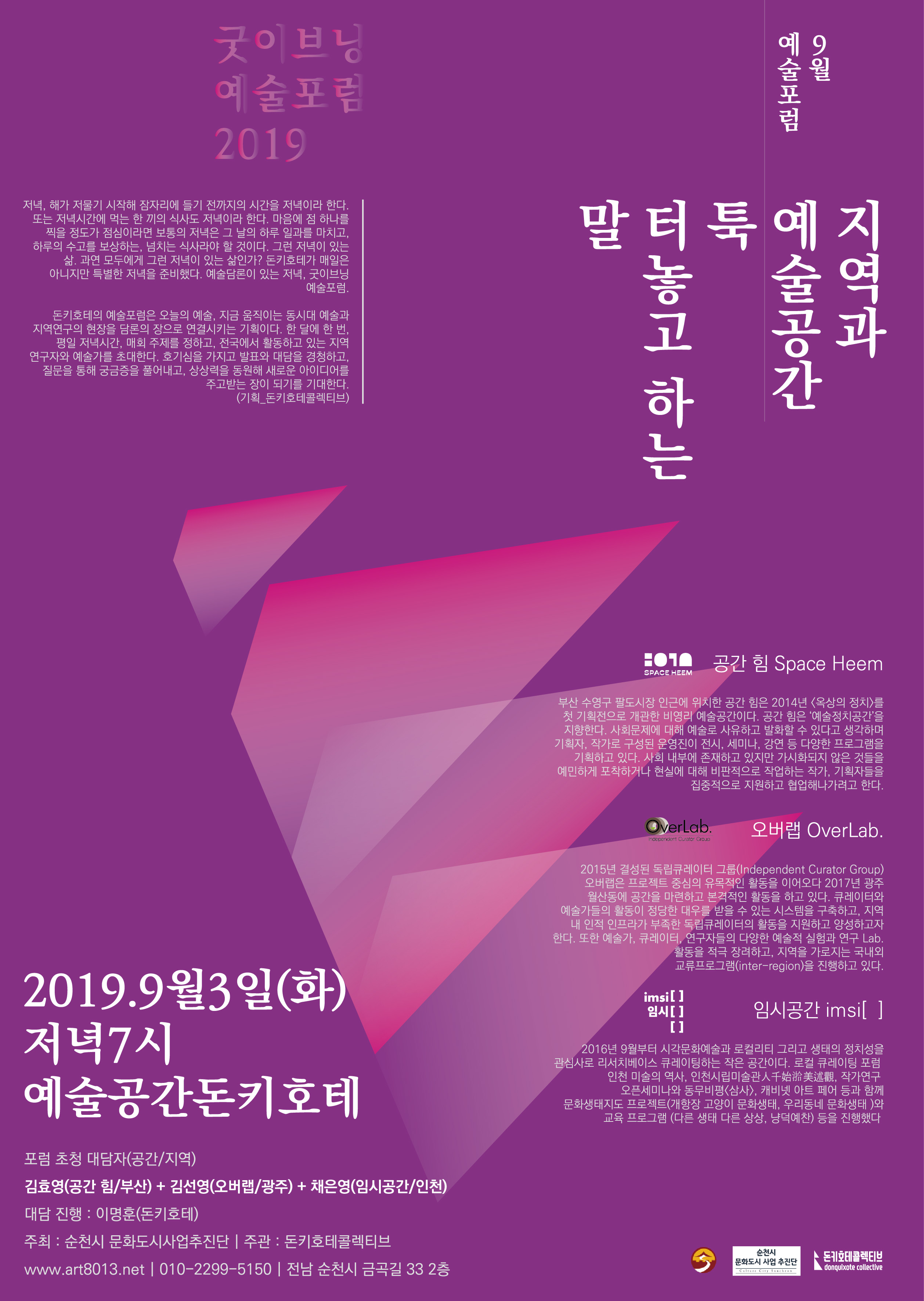
вҖӢ В көҝмқҙлёҢлӢқ мҳҲмҲ нҸ¬лҹј 2019_9мӣ” нҸ¬лҹј
м§Җм—ӯкіј мҳҲмҲ кіөк°„, нҲӯ н„°лҶ“кі н•ҳлҠ” л§җ
2019.9.3(нҷ”) м Җл…Ғ 7мӢңл¶Җн„° мҳҲмҲ кіөк°„лҸҲнӮӨнҳён…Ң
нҸ¬лҹј мҙҲмІӯ лҢҖлӢҙмһҗ(кіөк°„/м§Җм—ӯ) к№ҖнҡЁмҳҒ(кіөк°„ нһҳ/л¶ҖмӮ°) +к№Җм„ мҳҒ(мҳӨлІ„лһ©/кҙ‘мЈј) +мұ„мқҖмҳҒ(мһ„мӢңкіөк°„/мқёмІң) 진н–ү : мқҙлӘ…нӣҲ(лҸҲнӮӨнҳён…Ң) В В В В көҝмқҙлёҢлӢқ мҳҲмҲ нҸ¬лҹј 2019
м Җл…Ғ, н•ҙк°Җ м„ңмӮ°мқҙлӮҳ м„ңмӘҪ л°”лӢӨ л„ҲлЁёлЎң мһҗм·ЁлҘј к°җм¶ң л•Ңл¶Җн„°, лӢӨлҘҙкІҢ н‘ңнҳ„н•ҳл©ҙ н•ҙк°Җ м Җ л…ҳмңјлЎң л–Ём–ҙ진 мқҙнӣ„л¶Җн„°, л°қмқҢмқҙ м җм җ мӮ¬к·ёлқјл“Өкі мҷ„м „нһҲ м–ҙл‘җмӣҢм§Ҳ л•Ңк№Ңм§Җмқҳ мӢңк°„, мҰү лӮ®кіј л°Ө мӮ¬мқҙмқҳ мӢңк°„мқ„ вҖҳм Җл…ҒвҖҷмқҙлқј н•ңлӢӨ. лҳҗлҠ” м Җл…ҒмӢңк°„м—җ лЁ№лҠ” н•ң лҒјмқҳ мӢқмӮ¬лҸ„ вҖҳм Җл…ҒвҖҷмқҙлқј н•ңлӢӨ. л§ҲмқҢм—җ м җ н•ҳлӮҳлҘј м°Қмқ„ м •лҸ„к°Җ м җмӢ¬мқҙлқјл©ҙ ліҙнҶөмқҳ м Җл…ҒмқҖ к·ё лӮ мқҳ н•ҳлЈЁ мқјкіјлҘј л§Ҳм№ҳкі , н•ҳлЈЁмқҳ мҲҳкі лҘј ліҙмғҒн•ҳлҠ”, л„ҳм№ҳлҠ” мӢқмӮ¬лқјм•ј н• кІғмқҙлӢӨ. к·ёлҹ° м Җл…Ғмқҙ мһҲлҠ” мӮ¶мқ„ мҡ°лҰ¬лҠ” мӣҗн•ңлӢӨ. к·ёлҹ¬лӮҳ кіјм—° лӘЁл‘җм—җкІҢ м Җл…Ғмқҙ мһҲлҠ” мӮ¶мқҙ ліҙмһҘлҗҳлҠ”к°Җ? лӮҳ мһҗмӢ мқ„ нҸ¬н•Ён•ҙ, лӘЁл‘җм—җкІҢ м•Ҳл¶ҖлҘј 묻лҠ”лӢӨ. көҝмқҙлёҢлӢқ! лӘЁл‘җ мһҳ лЁ№кі мһҳ мӮҙм•ҳмңјл©ҙ мўӢкІ лӢӨ. к·ёлҹ¬мһҗкі , к·ёл ҮкІҢ н•ҙліҙмһҗкі , лҸҲнӮӨнҳён…Ңк°Җ л§ӨмқјмқҖ м•„лӢҲм§Җл§Ң нҠ№лі„н•ң м Җл…Ғмқ„ мӨҖ비н–ҲлӢӨ. мҳҲмҲ лӢҙлЎ , м„Өнҷ”к°Җ мһҲлҠ” м Җл…Ғ, мқҙкІғмқҙ көҝмқҙлёҢлӢқ мҳҲмҲ нҸ¬лҹјмқҙлӢӨ.В В лҸҲнӮӨнҳён…Ңмқҳ мҳҲмҲ нҸ¬лҹјмқҖ мҳӨлҠҳмқҳ мҳҲмҲ , м§ҖкёҲ мӣҖм§ҒмқҙлҠ” лҸҷмӢңлҢҖ мҳҲмҲ кіј м§Җм—ӯ м—°кө¬мқҳ нҳ„мһҘмқ„ лӢҙлЎ мқҳ мһҘмңјлЎң м—°кІ°мӢңнӮӨлҠ” кё°нҡҚмқҙлӢӨ. н•ң лӢ¬м—җ н•ң лІҲ, нҸүмқј м Җл…ҒмӢңк°„, л§ӨнҡҢ мЈјм ңлҘј м •н•ҳкі , м „көӯм—җм„ң нҷңлҸҷн•ҳкі мһҲлҠ” м§Җм—ӯ м—°кө¬мһҗмҷҖ мҳҲмҲ к°ҖлҘј мҙҲлҢҖн•ңлӢӨ. нҳёкё°мӢ¬мқ„ к°Җм§Җкі л°ңн‘ңмҷҖ лҢҖлӢҙмқ„ кІҪмІӯн•ҳкі , м§Ҳл¬ёмқ„ нҶөн•ҙ к¶ҒкёҲмҰқмқ„ н’Җм–ҙлӮҙкі , мғҒмғҒл Ҙмқ„ лҸҷмӣҗн•ҙ мғҲлЎңмҡҙ м•„мқҙл””м–ҙлҘј мЈјкі л°ӣлҠ” мһҘмқҙ лҗҳкё°лҘј кё°лҢҖн•ңлӢӨ.
9мӣ” мҳҲмҲ нҸ¬лҹјмқҳ мЈјм ң
м „көӯ к°Ғ м§Җм—җ лӢӨм–‘н•ң м •мІҙм„ұмқ„ к°Җм§Җкі мһҲлҠ” мҳҲмҲ кіөк°„л“Өмқҙ мһҲлӢӨ. мқҙл“Өмқҳ м„ӨлҰҪ нҳ„нҷ©кіј нҷңлҸҷм •ліҙлҘј н•ң лҲҲм—җ нҢҢм•…н• мҲҳ мһҲлҠ” лҚ°мқҙн„°к°Җ м •лҰ¬лҗҳм§Җ м•Ҡм•ҳм§Җл§Ң, м§Җм—ӯк°„ кіөк°„к°„ көҗлҘҳлӮҳ л„ӨнҠёмӣҢнҒ¬к°Җ 진н–үлҗҳкі мһҲлҠ”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ёлӢӨ. н•ң л•Ң, лҢҖм•Ҳкіөк°„мқҳ лӢҙлЎ кіј лӘЁлҚёмқҙ м „көӯмңјлЎң нҚјмЎҢкі , к·ё мқҙнӣ„м—җлҠ” мҳҲмҲ к°Җ л Ҳм§ҖлҚҳмӢңлқјлҠ” мқҙлҰ„мңјлЎң м§Җм—ӯ лҸ„мІҳм—җ м°Ҫмһ‘кіөк°„ н”Ңлһ«нҸјмқҙ кө¬м¶•лҗҳм–ҙ мһҲлӢӨ. мқҙл“Ө лӘЁл‘җ лҸҷмӢңлҢҖ мҳҲмҲ мқҳ кІҪн–Ҙкіј нҢҢкёүмқҙлқјлҠ” мёЎл©ҙм—җм„ң, мҳҲмҲ к°Җл“Өмқҳ м°Ҫмһ‘м§Җмӣҗкіј нҷҳкІҪмқҙлқјлҠ” мёЎл©ҙм—җм„ң мЈјлӘ©н• мҲҳ мһҲлҠ” м§Җм—ӯмқҳ мҳҲмҲ кіөк°„мқҙлқј н• мҲҳ мһҲлӢӨ. мқҙлҹ¬н•ң кіөк°„ ліҖнҷ”мқҳ нқҗлҰ„м—җм„ң мЈјлЎң м»Ён…ңнҸ¬лҹ¬лҰ¬ м•„нҠёлҘј лӢӨлЈЁлҠ” мҳҲмҲ кіөк°„л“Өмқҙ '비м„ңмҡё' м§Җм—ӯм—җм„ң мЎҙмһ¬н•ҳлҠ” л°©мӢқмқҖ м–ҙл–Ө кІғмқјк№Ң? к·ё к°ҖмҡҙлҚ° нҠ№нһҲ мҶҢк·ңлӘЁ мӮ¬м„Ө мҳҲмҲ кіөк°„л“ӨмқҖ м–ҙл–Ө м•„мқҙл””м–ҙмҷҖ нғңлҸ„лЎңм„ң мһҗмӢ л“Өмқҳ мһ…м§ҖлҘј лӢӨм§Җкі мһҲлҠ”м§Җ к¶ҒкёҲн–ҲлӢӨ.
лҸҲнӮӨнҳён…ҢлҠ” 비м„ңмҡё м§Җм—ӯм—җм„ң нҷңлҸҷн•ҳкі мһҲлҠ” мҳҲмҲ кіөк°„ : л¶ҖмӮ° кіөк°җ нһҳ, кҙ‘мЈј мҳӨлІ„лһ©, мқёмІң мһ„мӢңкіөк°„мқҳ мҡҙмҳҒмһҗлҘј мҙҲлҢҖн•ҙ 'м§Җм—ӯкіј мҳҲмҲ кіөк°„'м—җ лҢҖн•ҙ мқҙм•јкё°лҘј лӮҳлҲ ліҙкё°лЎң н–ҲлӢӨ. мқҙл“Ө м„ё кіөк°„мқ„ мҙҲлҢҖн•ң л°°кІҪм—җлҠ” лҸҲнӮӨнҳён…Ңк°Җ мқҙл“Өкіј лҠҗмҠЁн•ҳм§Җл§Ң м„ңлЎң м•Ңкі м§ҖлӮҙмҳЁ мӮ¬мқҙмҳҖлӢӨлҠ” м җмқҙ м»ёлӢӨ. кіөк°„к°„ м§Җм—ӯк°„ көҗлҘҳлқјлҠ” кІғмқҙ л”°м§Җкі ліҙл©ҙ мғҒнҳё мҷ•лһҳк°Җ мһҲм–ҙм•ј н•ҳлҠ”лҚ°, лҸҢм•„ліҙлӢҲ лҸҲнӮӨнҳён…Ңк°Җ кіөмӢқм ҒмңјлЎң мқҙл“Ө мҡҙмҳҒмһҗлҘј мҙҲмІӯн•ң м Ғмқҙ м—Ҷм—ҲлӢӨ. м„Өмҷ•м„ӨлһҳлӮҳ л’·лӢҙнҷ”лЎң м§Җм—ӯм—җ лҢҖн•ҙ, кіөк°„ мҡҙмҳҒм—җ лҢҖн•ҙ, н•ңкөӯмқҳ мҳҲмҲ нҢҗм—җ лҢҖн•ҙ л§ҺмқҖ мҚ°мқ„ н‘ј кІғ к°ҷмқҖлҚ°, кіөмӢқм Ғмқё мһҗлҰ¬м—җм„ң к°Ғмһҗкіөк°„мқҳ мҡҙмҳҒл°©мӢқмқҙлӮҳ л§һлӢҘлңЁлҰ° нҳ„мӢӨ, л¶Ҳнҷ•мӢӨн•ң(?) лҜёлһҳм—җ лҢҖн•ҙ мқҙм•јкё°лҘј лӮҳлҲҲ м Ғмқҙ м—Ҷм—ҲлӢӨ. мқҙл“Ө м„ё кіөк°„мқҖ вҖҳкҙ‘м—ӯмӢңвҖҷлқјлҠ” 비көҗм Ғ нҒ° к·ңлӘЁмқҳ лҸ„мӢңм—җ кё°л°ҳн•ҳкі , лҜёмҲ (мһҘлҘҙ)м—җ кё°л°ҳмқ„ л‘җкі мһҲлӢӨлҠ” м җмқҙ кіөнҶөм җмқҙлқј н• мҲҳ мһҲмһҗл§Ң, мӨ‘мҡ”н•ң кІғмқҖ м§Җм—ӯм Ғ л§ҘлқҪмқҙ лӢӨлҰ„м—җ л”°лқј 분лӘ… м•„мқҙл””м–ҙмҷҖ мҡҙмҳҒ м „лһөм—җ м°ЁмқҙлҘј к°Җм§Җкі мһҲлӢӨлҠ” м җмқҙлӢӨ. к·ёлҹ° м җм—җм„ң мқҙл“Ө м„ё кіөк°„мқ„ нҶөн•ҙ л¶ҖмӮ°-кҙ‘мЈј-мқёмІң м„ё м§Җм—ӯмқҳ нҠ№м„ұмқҙлӮҳ мҳҲмҲ нҷңлҸҷмқҳ л§ҘлқҪмқ„ мўҖлҚ” нҢҢм•…н• мҲҳ мһҲм§Җ м•Ҡмқ„к№ҢлқјлҠ” кё°лҢҖлҸ„ к°Җм ёліёлӢӨ.
3мһҗ лҳҗлҠ” (лҸҲнӮӨнҳён…ҢлҘј нҸ¬н•Ён•ҙ) 4мһҗк°„ вҖҳнҲӯ н„°лҶ“кі н•ҳлҠ” л§җвҖҷмқҙ лҗҳмһҗл©ҙ л¬ҙм—ҮліҙлӢӨ м„ңлЎңк°„ мӢ лў°к°җ, м№ңл°Җк°җмқҳ нҳ•м„ұмқҙ м „м ңлҗҳм–ҙм•ј н•ңлӢӨ. кі°кі°мқҙ мғқк°Ғн•ҙліҙлӢҲ м„ңлЎңм—җ лҢҖн•ҙ к№Ҡмқҙ мһҳ м•Ңкі мһҲлҠ” кІғлҸ„ м•„лӢҢ кІғмқҙм–ҙм„ң мқҙлІҲ м°ём—җ мҡ°лҰ¬к°Җ м–ҙл””к№Ңм§Җ нҲӯ н„°лҶ“кі л§җн• мҲҳ мһҲлҠ”м§ҖлҸ„ к¶ҒкёҲн–ҲлӢӨ. м„ңлЎңк°Җ м–ҙл””к№Ңм§Җ кіөк°җн• мҲҳ мһҲкі , кІ¬н•ҙлҘј лӢ¬лҰ¬н•ҳл©°, л§җмқ„ м•„лӮ„ кІғмқёк°Җм—җ лҢҖн•ҙм„ңлҸ„вҖҰ мқҙл“Ө мҙҲлҢҖмһҗм—җкІҢ мӮ¬м „м—җ лҚҳ진 м§Ҳл¬ёл“ӨмқҖ мқҙлҹ¬н•ҳлӢӨ. мҷң кіөк°„мқ„ л§Ңл“Ө мғқк°Ғмқ„ н–ҲлӮҳ? мқҙм „м—җлҠ” м–ҙл–Ө нҷңлҸҷмқ„ н–ҲлӮҳ? кіөк°„ мқҙлҰ„мқҖ м–ҙл–»кІҢ м§Җм—ҲлӮҳ? кіөк°„ л§Ҳл Ёкіј мЎ°м„ұм—җ м–јл§ҲлҘј нҲ¬мһҗн–ҲлӮҳ? лҲ„кө¬мҷҖ н•Ёк»ҳ мқјн•ҳлӮҳ? кіөк°„мқҖ м–ҙл–Ө нҷңлҸҷмқ„ н•ҙмҷ”лӮҳ? лҢҖн‘ңм Ғмқё кё°нҡҚмқҖ л¬ҙм—Үмқёк°Җ? мһ¬мӣҗмқҖ м–ҙл–»кІҢ л§Ҳл Ён•ҳлӮҳ? кіөк°„мқҳ лҸ…лҰҪм Ғмқё мҡҙмҳҒмқҖ к°ҖлҠҘн•ңк°Җ? м§Җм—ӯмқҖ м–јл§ҲлӮҳ нҳёмқҳм Ғмқёк°Җ? кіөк°„мқ„ м ‘мқ„ мғқк°Ғмқ„ н•ҙліё м ҒмқҖ м—ҶлӮҳ? м§Җм—ӯм—җм„ң мӢ мғқ мҳҲмҲ кіөк°„мқ„ л§Ңл“Өкі мһҗ н•ҳлҠ” лҲ„кө°к°Җм—җ н•ҙмЈјкі мӢ¶мқҖ мЎ°м–ёмқҙ мһҲлӢӨл©ҙ? кё°нғҖ л“ұл“ұ. лҚ”л¶Ҳм–ҙ мқҙлҹ° 추к°Җ м§Ҳл¬ёлҸ„ к°ҖлҠҘн•ҳлӢӨ. мӮ¬м„Ө мҡҙмҳҒ кіөк°„мқҳ мҡҙмҳҒмһҗлЎңм„ң к°ҷмқҖ м§Җм—ӯмқҳ кіөлҰҪ кіөк°„м—җ лҢҖн•ң мғқк°Ғл“Ө, м§Җм—ӯмқҳ мҳҲмҲ к°Җ лҳҗлҠ” л¬ёнҷ”н–үм •к°Җл“Өкіјмқҳ кҙҖкі„ л§әкё°мқҳ л°©мӢқ, мҙҲмӢ¬мқҖ л°”лҖҢм§Җ м•Ҡм•ҳлӮҳ? л“ұл“ұмқҙлӢӨ. (лҸҲнӮӨнҳён…Ң мҪңл үнӢ°лёҢ)
нҸ¬лҹј мҙҲлҢҖмһҗ(кіөк°„) мҶҢк°ң
кіөк°„ нһҳ Space Heem л¶ҖмӮ° мҲҳмҳҒкө¬ нҢ”лҸ„мӢңмһҘ мқёк·јм—җ мң„м№ҳн•ң кіөк°„ нһҳмқҖ 2014л…„ <мҳҘмғҒмқҳ м •м№ҳ>лҘј мІ« кё°нҡҚм „мңјлЎң к°ңкҙҖн•ң 비мҳҒлҰ¬ мҳҲмҲ кіөк°„мқҙлӢӨ. кіөк°„ нһҳмқҖ вҖҳмҳҲмҲ м •м№ҳкіөк°„вҖҷмқ„ м§Җн–Ҙн•ңлӢӨ. мӮ¬нҡҢл¬ём ңм—җ лҢҖн•ҙ мҳҲмҲ лЎң мӮ¬мң н•ҳкі л°ңнҷ”н• мҲҳ мһҲлӢӨкі мғқк°Ғн•ҳл©° кё°нҡҚмһҗ, мһ‘к°ҖлЎң кө¬м„ұлҗң мҡҙмҳҒ진мқҙ м „мӢң, м„ёлҜёлӮҳ, к°•м—° л“ұ лӢӨм–‘н•ң н”„лЎңк·ёлһЁмқ„ кё°нҡҚн•ҳкі мһҲлӢӨ. мӮ¬нҡҢ лӮҙл¶Җм—җ мЎҙмһ¬н•ҳкі мһҲм§Җл§Ң к°ҖмӢңнҷ”лҗҳм§Җ м•ҠмқҖ кІғл“Өмқ„ мҳҲлҜјн•ҳкІҢ нҸ¬м°©н•ҳкұ°лӮҳ нҳ„мӢӨм—җ лҢҖн•ҙ 비нҢҗм ҒмңјлЎң мһ‘м—…н•ҳлҠ” мһ‘к°Җ, кё°нҡҚмһҗл“Өмқ„ 집мӨ‘м ҒмңјлЎң м§Җмӣҗн•ҳкі нҳ‘м—…н•ҙлӮҳк°Җл Өкі н•ңлӢӨ. http://www.spaceheem.com spaceheem@naver.com к№ҖнҡЁмҳҒмқҖ кіөк°„ нһҳмқ„ кіөлҸҷмҡҙмҳҒн•ҳл©° м „мӢңлҘј кё°нҡҚн•ҳкі мһҲлӢӨ. мӮ¬нҡҢмқҳ нқҗлҰ„м—җ мҳҲлҜјн•ҳкІҢ л°ҳмқ‘н•ҳкі к°җмқ‘н•ҳлҠ” мӢңк°ҒмҳҲмҲ м—җ лҢҖн•ҙ кҙҖмӢ¬мқҙ л§Һкі , мӮ¬нҡҢл¬ём ңм—җ лӢӨм–‘н•ң мӢңм„ кіј л°ңнҷ”л“Өмқҙ көҗм°Ён• мҲҳ мһҲлҠ” м „мӢңлҘј кё°нҡҚн•ҳкі мһҗ н•ңлӢӨ.
мҳӨлІ„лһ© OverLab. 2015л…„ кІ°м„ұлҗң лҸ…лҰҪнҒҗл Ҳмқҙн„° к·ёлЈ№(Independent Curator Group) мҳӨлІ„лһ©мқҖ н”„лЎңм қнҠё мӨ‘мӢ¬мқҳ мң лӘ©м Ғмқё нҷңлҸҷмқ„ мқҙм–ҙмҳӨлӢӨ 2017л…„ кҙ‘мЈј мӣ”мӮ°лҸҷм—җ кіөк°„мқ„ л§Ҳл Ён•ҳкі ліёкІ©м Ғмқё нҷңлҸҷмқ„ н•ҳкі мһҲлӢӨ. нҒҗл Ҳмқҙн„°мҷҖ мҳҲмҲ к°Җл“Өмқҳ нҷңлҸҷмқҙ м •лӢ№н•ң лҢҖмҡ°лҘј л°ӣмқ„ мҲҳ мһҲлҠ” мӢңмҠӨн…ңмқ„ кө¬м¶•н•ҳкі , м§Җм—ӯ лӮҙ мқём Ғ мқён”„лқјк°Җ л¶ҖмЎұн•ң лҸ…лҰҪнҒҗл Ҳмқҙн„°мқҳ нҷңлҸҷмқ„ м§Җмӣҗн•ҳкі м–‘м„ұн•ҳкі мһҗ н•ңлӢӨ. лҳҗн•ң мҳҲмҲ к°Җ, нҒҗл Ҳмқҙн„°, м—°кө¬мһҗл“Өмқҳ лӢӨм–‘н•ң мҳҲмҲ м Ғ мӢӨн—ҳкіј м—°кө¬ Lab. нҷңлҸҷмқ„ м Ғк·№ мһҘл Өн•ҳкі , м§Җм—ӯмқ„ к°ҖлЎңм§ҖлҠ” көӯлӮҙмҷё көҗлҘҳн”„лЎңк·ёлһЁ(inter-region)мқ„ 진н–үн•ҳкі мһҲлӢӨ. http://overlab.creatorlink.net overlab2015@gmail.com к№Җм„ мҳҒмқҖ 2015л…„ м„ӨлҰҪлҗң 비мҳҒлҰ¬ нҒҗл Ҳмқҙн„° к·ёлЈ№ 'OverLab.вҖҷмқҳ лҢҖн‘ңмқҙмһҗ лҸ…лҰҪнҒҗл Ҳмқҙн„°мқҙлӢӨ. кҙ‘мЈјкҙ‘м—ӯмӢңлҘј кё°л°ҳмңјлЎң нҷңлҸҷн•ҳкі мһҲмңјл©°, 2005л…„л¶Җн„° 3л…„к°„ м•„мӢңм•„л¬ёнҷ”мӨ‘мӢ¬лҸ„мӢң мЎ°м„ұмӮ¬м—…м—җ лӢӨмҲҳ м°ём—¬н•ҳмҳҖлӢӨ. м§Җм—ӯ лӮҙ мІ« лҢҖм•Ҳкіөк°„мқё 'л§Өк°ңкіөк°„ лҜёлӮҳлҰ¬'м—җ н•©лҘҳн•ҙ лҢҖмқёмҳҲмҲ мӢңмһҘ н”„лЎңм қнҠё(2009)лҘј 진н–үн•ҳмҳҖкі , 'лҜён…Ң-мҡ°к·ёлЎң' кіөлҸҷл””л үн„°(2011)лҘј м—ӯмһ„н•ҳмҳҖлӢӨ. 2013л…„л¶Җн„° лҜјк°„м°Ёмӣҗмқҳ м§Ғм ‘көҗлҘҳлҘј мң„н•ң м•„мӢңм•„ м§Җм—ӯмқ„ лҰ¬м„ңм№ҳн•ҳкі мһҲмңјл©°, нҳ„мһҘмӨ‘мӢ¬мқҳ мҶҢнҶөкіј мӢӨн—ҳм Ғ мһ‘м—…м—җ 비мӨ‘мқ„ л‘” кё°нҡҚмқ„ н•ҳкі мһҗ н•ңлӢӨ. нҠ№нһҲ м§Җм—ӯ лӮҙ мқём Ғ мқён”„лқјк°Җ л¶ҖмЎұн•ң лҸ…лҰҪнҒҗл Ҳмқҙн„°л“Өмқҳ нҷңлҸҷмқ„ м§Җмӣҗ л°Ҹ м–‘м„ұн•ҳлҠ” н”„лЎңк·ёлһЁкіј нҳ„лҢҖлҜёмҲ мӢӨн—ҳмқ„ мң„н•ң көӯм ңкөҗлҘҳмҷҖ кіөлҸҷм°Ҫмһ‘мқ„ м ңм•Ҳн•ҳкі мһҲлӢӨ.
мһ„мӢңкіөк°„ imsi[ ] 2016л…„ 9мӣ”л¶Җн„° мӢңк°Ғл¬ёнҷ”мҳҲмҲ кіј лЎң컬лҰ¬нӢ° к·ёлҰ¬кі мғқнғңмқҳ м •м№ҳм„ұмқ„ кҙҖмӢ¬мӮ¬лЎң лҰ¬м„ңм№ҳлІ мқҙмҠӨ нҒҗл ҲмқҙнҢ…н•ҳлҠ” мһ‘мқҖ кіөк°„мқҙлӢӨ. лЎң컬 нҒҗл ҲмқҙнҢ… нҸ¬лҹј, мқёмІң лҜёмҲ мқҳ м—ӯмӮ¬, мқёмІңмӢңлҰҪлҜёмҲ кҙҖ(дәәеҚғе§Ӣ?зҫҺиҝ°и§Җ), мһ‘к°Җм—°кө¬, мҳӨн”Ҳм„ёлҜёлӮҳмҷҖ лҸҷл¬ҙ비нҸү<мӮјмӮ¬>, мәҗ비넷 м•„нҠёнҺҳм–ҙ л“ұкіј н•Ёк»ҳ л¬ёнҷ”мғқнғңм§ҖлҸ„ н”„лЎңм қнҠё(к°ңн•ӯмһҘ кі м–‘мқҙ л¬ёнҷ”мғқнғң, мҡ°лҰ¬лҸҷл„Ө л¬ёнҷ”мғқнғң )мҷҖ көҗмңЎ н”„лЎңк·ёлһЁ (лӢӨлҘё мғқнғң лӢӨлҘё мғҒмғҒ, лғҘлҚ•мҳҲм°¬) л“ұмқ„ 진н–үн–ҲлӢӨ. http://spaceimsi.com info.spaceimsi@gmail.com мұ„мқҖмҳҒмқҖ нҶөкі„н•ҷ, л¬ёнҷ”мҳҲмҲ кІҪмҳҒ, лҜёмҲ мқҙлЎ мқ„ кіөл¶Җн–ҲлӢӨ. лҸ„мӢңкіөк°„м—җм„ң мһҗліёкіј м ңлҸ„мҷҖ кұҙк°•н•ң кёҙмһҘ кҙҖкі„лҘј к°Җ진 мӢңк°Ғл¬ёнҷ”мҳҲмҲ мқҳ мғҒмғҒкіј мӢӨмІңм—җ кҙҖмӢ¬мқҙ л§ҺмқҖ мқён„°-лЎң컬 нҒҗл Ҳмқҙн„°мқҙлӢӨ. лҢҖм•Ҳкіөк°„н’Җ, мҡ°лҜјм•„нҠём„јн„°м—җм„ң мқјн–Ҳкі 2017л…„л¶Җн„° мһ„мӢңкіөк°„мқ„ мҡҙмҳҒн•ҳл©ҙм„ң лҸ…лҰҪнҒҗл Ҳмқҙн„°лЎң нҷңлҸҷ мӨ‘мқҙлӢӨ.В В  В В
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