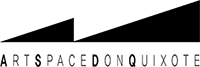|
(*이 글은 한국문화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 웹진 [문화정책리뷰] 2022년 특집 기사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6) 100인의 제안"(2022.7.18.발행)에 기고한 글이다.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를 묻다, 100인의 제안 1. 자유-문화예술의 그만한 자유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 번 튀어나왔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본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 예술가, 문화기획자들은 양심과,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데 거리낌은 없는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말을 문화예술계에 적용시켜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해진다. 예술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허가, 검열에 대한 제도적 성찰과 숙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각종 예술 공모와 심의, 평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임의적 자기검열의 문제, ‘미풍양속’이라는 보수적 문화예술관 등이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제도적 성찰이 필요하다. 단계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소위 결제라인에 있는 ‘윗대가리’들의 지성의 수준, 그들의 양심, 판단력에 어떤 성찰이 있을지,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그런 유령사회가 되지 않기를. 주어진 직무와 권한을 잘 따져보길 바란다. 2. 공유-체계적이며 정성을 다하는 자유의 가치와 함께 공유의 가치도 중요하다. 예술이 자유주의적이라면 문화는 민주주의적이다. 그런 면에서 예술과 문화의 성질을 동일하게 사고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란 공감을 통해 보다 집단적으로 향유되는 성질이 강하다. 다만, 소수가 향유하는 문화도 존중되어야 한다. 각종 문화행사의 평가를 ‘정량적’으로만 따지지 않고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성적 평가가 보다 중요한 것인데, 다소 ‘주관적’이라는 이유에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문화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문화사업의 평가 역시 ‘양보다 질’에 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양이 아닌 질적 성장과 성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업의 평가보고서는 가능한 찾기 쉽게 공개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아카이빙 되어야 한다. 내부적인 행정용, 감사용 자료생산과 관리체계가 아니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누구나 살펴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유-생태적이며 정치적인 한국의 문화예술계에 ‘생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이 다원화되고 다양한 종들이 출현했음을 말해 준다. 생태계를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로만 사유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어떤 종을 선택적으로 멸종시키거나 몰아가는 것, 문화유전자를 조작하는 것, 성공 신화를 조장하는 것 등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적,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멀리, 넓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국뽕”-정치의 미학화에 지나치게 정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 정권의 연장을 위해, 승진을 위해 문화와 예술이, 정책과 예산이 사유화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문화만큼은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 자율적 집단지성을 육성하는 것, 문화 권력을 분배하는 것,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등등 풀어야 할 의제가 넘치고 넘친다. 표면만이 아닌 그 속을 보아야 한다. 그 엉망인 속을. 글_이명훈(예술공간돈키호테) 기사 원문 링크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223
|